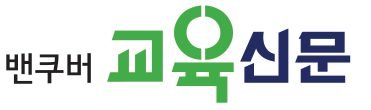한인 이승돈 씨, 문학사랑 신인 작품상 수상
한인 이승돈 씨, 문학사랑 신인 작품상 수상<글·사진 이지은 기자>
제 103회 ‘문학사랑’ 신인 작품상에 이승돈 씨가 수상하며 시인으로 등단했다. 작년 12월 9일, 올 해의 시 부분에서 당선된 시는 탄포포의 바람 길, 돌려막는 눈물 한 컷, 나무들의 마중물, 강남꽃과 우리들, 누에들의 얘기 바다 총 5편이다. 이승돈 씨는 <시조문학> 추천으로 등단한 후 시조집 ‘마음의 바닥짐’을 발간한 등단 38년차 중견 시조시인이다. 서울에서 교사생활로 20여년 재직한 후 밴쿠버로 이주했다. 현재 캐나다 한인 문학가 협회에서 활동 중이다. 리헌석 문학 평론가는 “유려한 문체와 절정할 수 없는 상상력이 돋보인다. 한국에서 또는 캐나다에서 우리 말글을 다듬으며 자신의 내면의 상상력을 채색하여 내놓을 그의 작품이 기다려지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평했다.
1977년 동인지로 출발해 문학전문 계간지로 발행된 <문학사랑>은 현재까지 수많은 신인 문학인들의 등용문으로 잘 알려져 있다.
MINI INTERVIEW_이승돈 시인
Q 시집 발간까지 과정은
재학시절 ‘시와 시조’를 교내 신문과 학보에 싣거나 동아리 ‘한대문학’과 지역신문 등에 소개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이후 영남지역 중견 시조시인들로 구성된 ‘낙강’ 동인으로 활동 중 ‘시조문학’지에 이태극 씨의 추천으로 등단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가을에는 ‘문학사랑’이 주관하는 신인문학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Q 시집 발간 이유
살다보면 누구나 말이든 행위로 흔적을 남기게 되는데 시집 또한 그 누에고치 같은 작은 저의 허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을 하건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는 노력이어야겠기에 지극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제 시에다 그 분에 대한 사랑과 찬양을 접목시켜 본 겁니다.
Q ‘예고된 길, 뜻밖의 예감’ 제목의 의미
그리스도인들을 ‘길(Road)’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성서의 주제는 낙원을 회복시킨다는 (실낙원, 복낙원) ‘예고된 길’이었고 이 성취방법에서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즉 ‘예상 밖의 예상’이란 결론을 개인적으로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를테면 모세가 이집트 파라오에게 쫓겨 홍해 앞에 이르러 망연자실했을 때야 비로소 바다가 열리는 예상 밖의 기적이나, 히스기야왕이 산헤립 군대에게 포위되어 몰락의 기로에 있었을 때 하룻밤 사이에 한 천사로하여금 18만 5천명의 적을 앗아가게한 예 등은 가히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예상이었습니다.
가끔 우리 주위에서도 하느님 영의 도움으로 작지만 소름끼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뭐 그런 ‘뜻밖에 예감’을 함께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Q 8부의 내용 소개
순번을 이렇게 배열한 이유는 한국을 방문하고 책을 내려던 시점이 여름철이라 비교적 강과 바다를 소재로 한 1,2부를 앞에 오도록 했습니다. 이민생활의 고단함과 떠나기 전 제주생활을 그렸고 3부는 겨울 눈과 산행으로 ‘극한 속의 여유’ 같은 시련의 체험입니다. .
4부에서는 작은 삶 속의 지혜와 부활의 바램, 5부에서는 나름대로 그리스도인의 참소식으로 방점을 찍고 싶었습니다. 6, 7부에서는 흩어진 가족을 둔 아둔한 추억들, 마지막 8부는 부록과 같은 퍽 오래되고 난감한 부산물의 일부라 할 수 있습니다.
Q 애착이 가는 시는
‘강낭꽃과 우리들’이나 ‘별과 숲의 눈물샘’, ‘제주 돌담’, ‘누에들의 얘기바다’, ‘민들레로 여민 봄날’ 정도입니다. 자연과 함께 교감하면서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의 삶을 고통과 좌절없는 시로 표현해 미래지향적인 대안으로 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쉽게 씌여진 이런 시가 애착이 갑니다.
Q 앞으로의 활동
특별히 개인적인 계획 같은 건 없지만 국내보다 활동이 현저히 열악한 이곳에서 한때 정들었던 모임을 좀 더 활성화시켜 보고픈 바램은 있습니다. 사실 제가 다시 시를 쓰도록 계기를 준 곳이기도 하고 작은 상을 받기도 했기 때문에 더 그런 듯 합니다.
Q 한인사회에 한마디
먼 이국땅까지 오셔서 고된 생업에 종사하며 자녀를 뒷바라지 하시는 부모님이나 힘든 학업에 몰두하는 자녀 입장의 모든 교민 여러분들이 계속 기쁨과 희망을 잃지 않으시는 건강한 모습의 또 한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쩌다 제 시를 만나게 되실 때 저의 웃음이 삶의 작은 위로와 의지에 보탬이 되셨으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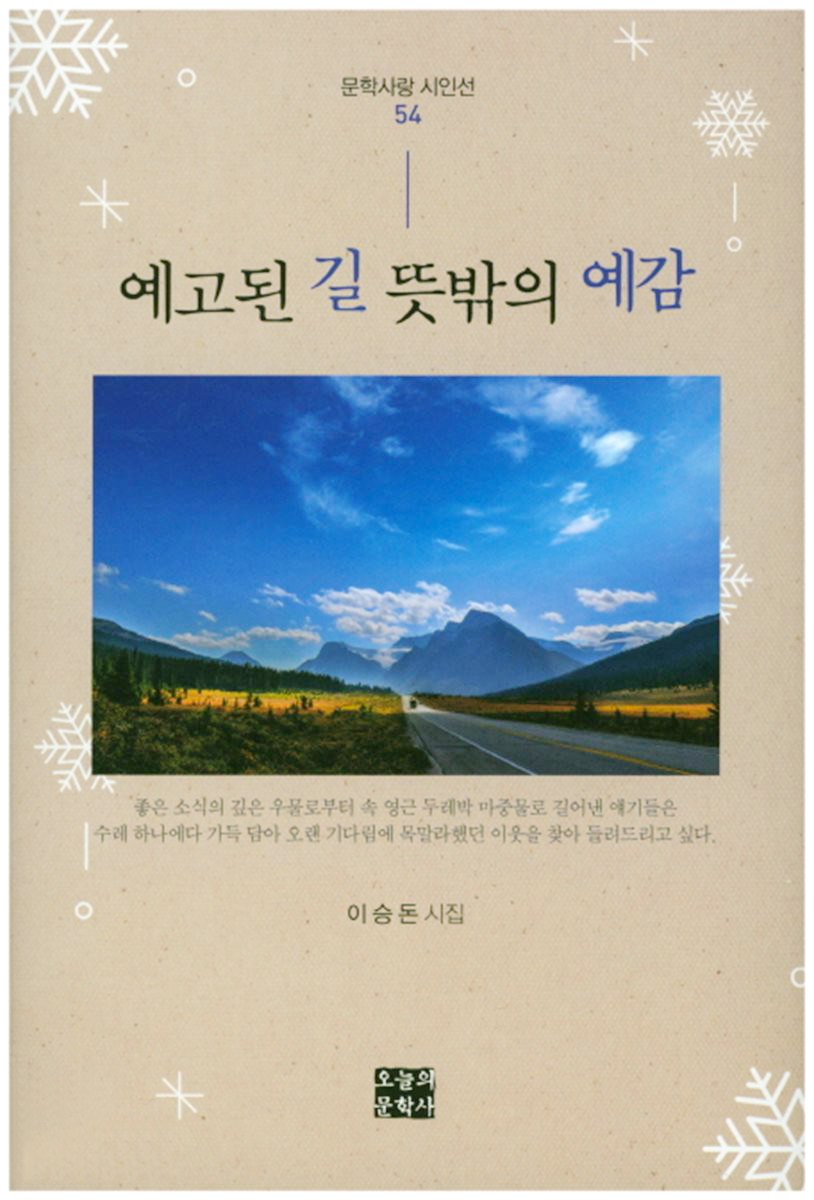 강낭꽃과 우리들
강낭꽃과 우리들어둠에서 깨어난 강낭꽃 새 순이
함께 웃자며 한 뼘씩 아침 건너올 때도
너는 하루를 바람처럼 구겨 버렸지
한 둘 강낭꽃잎 떠나보내고
서너 넓은 잎들도 자취 감춘 다음이
내 차례란 걸 어찌 알기나 했겠어
네가 이미 소유하고 있었거나
정말 가질 기회가 주어졌울 때도 그게
실로 큰 기쁨이 되는지 몰랐다 해서
새삼 누구를 탓하는 건 아니다
식구들로 감싼 알곡 강낭콩이 예비
서로를 깊이 지금 간직하게 되면
아직 잃거나 떠나보낸 것이 아니라
단지 잊고 산 걸로 치부되는 거니까
강낭콩처럼 여며둔 그 마음속에
움 튼 예쁜 싹들이 자라나면
몸통마다 네 생각도 여물어지면
그러면 그게 다시 꽃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린 짐작으로만 모든 걸 안다며
누군가 쏟은 정성 기억 못 한 적 있지
또 나눌 줄은 더욱 몰랐던 거지
오래 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거나
스스로 눈 뜨지 못한 소식 때문에
떠난 후에 내게 남은 어리석음들
어제처럼 부실한 마른 껍질 내고
강낭콩의 든든한 씨종자 매달지 않아
우리들 겨울 천정은 늘 쓸쓸하고
자신조차 응시 못한 법이었기로서니
누에들의 얘기 바다
바다가 보이는 곳에 눕고 싶다.
누에처럼 푸른 뽕잎 먹고
하얗게 목덜미 세운 파도들이
사그락 사락 뭍 기어오르는 언덕
호기심 많은 물고기가
물 위로 솟구쳤다 놀랍게
새에게 채어가는 동안에도
햇볕 쪼이며 않은 조약돌은
줄곧 시치미만 떼고 있고
수심을 짐작할 수 없는 곳에선
바위틈 살랑대는 해초들이
보물지도를 놓고 수런거린다.
배 지어 어부로 나서고 싶다.
밤 눈 가득 밝힌 누에들과
둥글게 수면 위로 몸 굴리면
어제와 조금도 낯설지 않은
파도소리 나를 어루만진다.
바다는 별들 가득 밑밥 뿌려
누에들 조상 적부터 머금은 얘기
그물로 자꾸 거두기만 하여도
하루 세끼 밥을 내주곤 했고
바쁘게 향로 이탈한 배들의
갈매기가 끌고 간 수평선으로는
술 먹은 달이 발 헛딛고 만다.
누에처럼 실 잦고 싶다.
파도에 떠밀려온 섬 하나
거문고처럼 덥석 안길 때
푸른 물결 아슴했던 뽕밭은
출구 도배해놓은 마지막잠 고치실
월척 떠올려 얘기판을 키우고
해저에 닿고도 남을 실마리 푼다.
손가락 숭숭 드나드는 개펄
눈꺼풀 덮은 바지락꿈 캐느라
팔소매 걷어붙인 우리들은
포획된 누에들의 이야기 실 뽑아
땀에 젖은 하루치 노래로 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