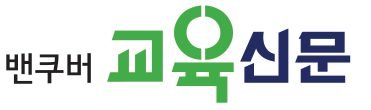새우 중에 보리새우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이 녀석은 자라면서 여러 차례 허물을 벗죠. 그리고 그때마다 조금씩 성장을 한답니다. 그런데 점점 커갈수록 허물 벗는 것이 힘들고 느려집니다. 몸집에 비례해서 그 만큼 껍질이 딱딱해 유연성이 적고 또 힘에 부치도록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껍질을 못 벗게 되면 자기 껍질에 갇혀서 죽는 답니다.
비슷한 경우로 허물 벗는 뱀을 들 수 있겠는데, 어디 지나다가 나무 가시 같은데 긁혀 상처가 나거나 하면 그 상처가 아물면서 굳은 살이 되고 나중에 허물 벗을 때 그 굳은 살이 장애가 돼서 허물이 안 벗겨집니다.
허물을 제때 벗지 못하면 아까 말씀드린 보리새우처럼 자기 허물에 갇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삶의 부분 부분이 굳어져 갈 중년의 시기에 일찍이 버려야 할 것이 버리지 못한 상처들과 아픈 기억들을 더 이상 굳은 살 되지 않도록 돌아보고 털어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굳어지고 고착되어 가는 자신만의 편견이나 아집들 또한 일찍이 깨뜨려 늘 깨어있는 의식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를 버리지 못하면 나에 갇혀서 죽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처로 인해 슬픔과 아픔만이 마음을 온통 지배하는 순간엔 내 마음이 슬픔과 아픔으로 적개심과 괴로움만 남아버리게 되지요. 내게 나쁜 말이나 행동을 한 사람은 이미 잊어버리고-허물을 벗어버리고-
또 다른 세상에서 자유롭게 사는데 나 혼자만 그 순간을 벗어나지 못하고 굳어가는 상처는 결국엔 나를 허물을 벗지 못하게 하여 그 속에 가두어 두어 버리게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내가 상처 준 사람은 잘 살고 내가 힘든시간의 동굴에 갖혀있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미처럼 사랑하는 이를 부르다 한 평생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러려고 애벌레에서 매미가 된 것은 아닐텐데 하면서 말이지요. 괴로움은 괴로움을 낳고 상처가 되어 허물을 벗을 수 없어 갖혀서 죽게 되는 .것이다.
사람은 이제 집을 사지 집을 짓지 않는다. 여러분은 등산을 가서 텐트를 쳐보셨을 겁니다. 이미 다 만들어진 텐트도 막상 뼈대를 조립하고 천을 씌워서 텐트를 완성하려고 하면 쉬운 일이 아니란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이제는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되어 언제라도 없어져 버릴 수도 있는 물고기 종인 가시고기는 그 부성애 때문에 소설로도 만들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는 물고기이기도 합니다.
필요하면 바뀌게 되는 것이 몸의 일부이기도 한가봅니다. 가시고기의 가시는 사실 지느러미가 필요에 의해서 가시처럼 변하게 된 것이지요.
수초 나갈 대뿌리 등을 이용해서 집을 짓고 여러 마리의 암컷이 알을 낳고 나면 알 위에 수컷이 사정을 하는 것이지요.
살몬들이 수백키로를 거슬러 올라가 알을 낳고 자신의 최후를 다하듯 가시고 기도알을 낳은 암컷은 알을 낳고 죽고 수컷은 알이 부화할때까지 지킨다고 하지요.
대부분의 씨앗은 새싹을 이자라면서 씨앗의 영양분을 먹고 자라게 되지요.
물론 떡잎이 날 때까지는 씨앗의 보호 아래 아이가 태속에서 구부리고 있듯이 구부린 식물이 자라게 되고요. 우렁이 또한 알아서 부화가 되면 엄마의 살을 파먹으면서 자라게 된다.
우렁이가 어미가 있는 바깥의 세상에 나오지 않고 안전한 세상에서 어미의 살을 파먹으면서 살다가 혼자 움직이며 살 수 있어야 바깥 세상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미 자기를 다 자식인 새끼 달팽이에게 주고 남은 것은 빈껍질 뿐인 우렁이집 만물살에 둥둥 떠다니게 되어 버린다.
자신이 어미를 다 파 먹어서 둥둥 떠다니는 어미 우렁이를 자식들은 훨훨 날아서 자신을 떠나간다고 아쉬워하지요. 자기가 다 파먹어서 남아 있지도 않은 어미 우렁이에게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음을 아쉬워하면서.
부모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고 껍질 밖에 남지 않아서도 자식 걱정에 웅웅소리를 내죠. 파도소리를 내면서 자식을 걱정하는 우렁이처럼 쭈글쭈글한 가죽만 남은 세상의 어머니들은 자나깨나 자식들 걱정뿐인 세상.
가시고기도 연어도 자식을 위해 최후를 맞이하면서도 걱정스러워하듯 도시의 많은 부모들은 둥지라도 마련해주려고 애쓰지만 입으로 물어 올 수 초도 등짐으로 져서 나를 진흙도 없고 자녀들도 원하지 않는 부모의 사랑처럼 그저 파먹히는 우렁이처럼 자신을 내어주고 나의 분신을 바라볼 뿐입니다.
자신이 자식에게 살을 내어 주고 파먹히면서 나의 엄마도 그러했겠구나하고 깨닫듯이 우리는 어쩌면 늘 들리는 것만 들으려하고 보고 싶은 것 만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장애자 아이를 두고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아버지가 라면 밖에 먹일 수 없는 자신을 미워하고 딸을 걱정하는 마음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듯이 우린 모두가 자신의 껍질에 갇혀서 죽어가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