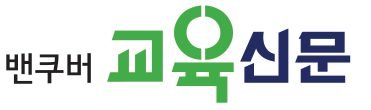최우수상 A 그룹 이연서 11학년 Semiahmoo Secondary School
가족
평소와 같이 해가 지기 시작할 때에 큰이모와 개천으로 산책을 나갔다. 우리는 함께 오늘 뜬 달을 바라보며 걸었다.
“어머, 연서야 달이 손톱 같다.” 큰이모가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러게요 이모, 목련도 너무 이뻐요. 나중에 날이 조금 더 선선해지면 같이 음료수
사서 자전거 타고 한강에 가는 거 어때요?” 내가 웃으며 대답했다.
집에 돌아와 할머니 할아버지께 인사를 드렸다.
“연서 왔구나.” 할머니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그때 엘이가 뒤뚱뒤뚱 내게 다가와 몸을 비비며 애교를 부렸다. 나는 엘이의 퐁신퐁신 하고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삼촌이 나타나더니 말했다.
“야, 엘이 그만 쓰다듬고 아이스크림 사러 가자!”
“삼촌, 오늘은 아이스크림이야? 어제는 치킨이었는데?” 내가 웃으며 물었다.
그러자 엄마가 옆에서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넌 무슨 맨날 밥 먹고 치킨, 피자, 아이스크림을 후식으로 시켜. 못 말려 진짜!”
“하하 하하!”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고, 나도 함께 웃으며 엘이를 더욱 다정하게
쓰다듬었다. 산들거리는 바람이 창문 사이로 들어와 커튼을 살랑거렸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평화로웠다. 그런데 이상했다. 뭔가 어긋나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잠깐, 나는 지금 캐나다에 있어야 하는데… 왜 여기에 있지?’ 의문이 스쳐 지나갔지만 애써 무시하려 했다. 너무나 행복한 순간이었으니까. 하지만 그 순간, 내 손에 닿은 건 엘이의 따뜻하고 보드라운 털이 아니라 차가운 이불이었다.
“아… 뭐야, 한국이 아니잖아.”
모든 것이 꿈이었다. 엘이도, 삼촌의 장난스러운 말도, 엄마의 웃음소리도, 그 따뜻했던 모든 순간들이. 왜 이런 꿈을 꾼 거지? 한국과 캐나다에서의 생활은 굉장히 다르다. 복작복작하게 온 가족이 둘러앉아 순간을 공유하는 그런 일상은 고독한 캐나다의 생활과 극심한 비교를 이룬다. 이런 꿈을 꿀 때마다 서늘한 바람이 심장을 훑고 지나가는 것 같다. 그리운 이들을 꿈꾸는 건 좋은 걸까, 나쁜 걸까. 그리움이란 참 묘하다. 심장을 조이면서도 동시에 따뜻한 위로가 된다. 지난날의 모든 기억들은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가슴 깊은 곳에 담긴다.
한 세상이 사라지고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 늘어간다는 것은 슬픔으로만 다가온다. 얼마만큼 그리워하며 떠난 이를 위해 슬퍼해야 하는 시간은 언제까지일까. 누군가를 뒤로하고 일상생활을 무사히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까.
꿈은 구름과도 같다. 잡고 싶지만 손에 잡히지 않는다. 멀리서 보아야만 형체가 보인다. 간직하고 기억해내려 해도 무심하게 흩어져 버린다. 마치 신기루처럼. 옛이야기에서 이르길, 환수 신이 뿜은 숨결은 구름이 되는데, 그 구름의 모양이 잘생긴 누각과 같이 허공에 맺힌다고 한다. 그 모습이 매우 아름다워 반하는 자는 많으나 보이기만 하고 갈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것이니, 이것을 신기루라 하였다고 한다. 가족의 추억도 그렇지 않을까. 아스라이 멀어져도 가끔씩 선명하게 떠오른다.
가족들에게 조금 있다가 만나자고 약속을 하는데 당연히 내가 한국에 있다고 생각했다. 꿈에서도 이상함을 느꼈지만 애써 무시하고 기쁜 마음으로 약속을 잡았다.
엘이는 언제나 그랬듯이 스르륵 다가와 몸을 비벼대었고, 나는 모든 애정과 사랑을 담은 손길을 건넸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내 상상일 뿐이라는 걸 자각하고는 얼마나 허탈했는지 모른다. ‘엘아, 내 마음을 전할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실제로도 내 체온이 묻은 이불을 쓰다듬었다. 어젯밤 세운 계획에 맞춘 기상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의치 않았고, 꿈이어도 좋으니 더 기억해 내고 싶어 다시 그 속으로 들어가길 선택했다. 하지만 실제 함께 보낸 시간에서의 모습은 무엇보다 더 기쁜 기억을 심어주었으며 그 순간을 이겨낼 원동력이 되었다. 가족과의 시간은 때로는 평범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특별한 의미가 담겨있다. 일상의 작은 대화, 식탁에서 나누는 소소한 이야기, 함께 바라보는 TV 속 풍경까지.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이루는 바탕이 되었다. 내가 왜 이런 노래를 좋아하고, 어떤 음식에 정이 가는지, 심지어 왜 이런 말투를 쓰는지까지.
가족은 우리가 선택하지 않고 태어나 만난 첫 세상이다. 함께했던 시간의 양을 뒤로하고 그들이 나에게 전해준 사랑은 평생 나를 지켜줄 힘이 될 것이다. 세상의 틀을 의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 언제나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그런 관계, 평생 함께 해도 더욱더 함께 있고 싶은 그런 관계가 바로 가족이다.
어머니의 따스한 손길, 아버지의 든든한 어깨, 형제자매와의 투정과 다툼까지. 그 모든 것이 모여 나의 근원이 되었다. 기쁨을 나눌 때는 두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눌 때는 반으로 줄어드는 마법 같은 존재들.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지만, 그 상처조차도 결국은 더 깊은 이해와 사랑으로 치유된다. 가끔은 나도 모르게 그들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나를 발견하고 놀란다. 피는 못 속이는 걸까.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더욱 그 존재가 크게 느껴지는 것이 가족이다. 명절날 둘러앉은 식탁에서, 아플 때 걱정하는 전화 너머로,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는 서로를 찾는다. 세월이 흘러도 가족은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고향과 같다. 그 불완전함조차 완벽하게 느껴지는 유일한 존재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우리 마음속에 자리한 영원한 쉼터, 그것이 가족의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