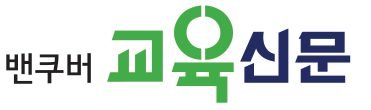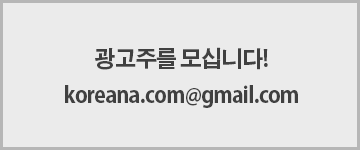가을이 오면 BC 주의 강들은 붉게 물든다. 단풍 때문만이 아니다. 수백만 마리의 연어가 고향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코퀴틀람의 호이 크릭, 포트 코퀴틀람의 하이드 크릭, 이 도시 한복판의 작은 물길에도 연어들은 어김없이 찾아온다. 하지만 진정한 장관을 보려면 BC 주 내륙 깊숙한 곳, 아담스강(Adams River)으로 가야 한다. 올해 태평양에서 프레이저 강을 따라 돌아오는 연어는 천만 마리. 그중 이백만 마리 이상이 아담스 강을 붉게 물들인다. 지난 10 년 중 최대 규모다. 아담스 강은 4 년마다 한 번씩 이런 대회귀를 맞는다.
과학자들은 내년 2026 년 10월에 또 한 번의 큰 회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어는 어떻게 자신이 태어난 강을 기억하는 걸까? 학자들은 오랫동안 이 물음에 매혹되어 왔다. 모천회귀, 회귀본능, 귀소본능. 현상에 이름은 붙였지만 그 신비의 본질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일본의 한 학자는 아미노산 냄새를 따라간다고 했고, 오리건 주립대 교수는 지구 자기장(磁氣場, magnetic field)을 읽는다고 주장했다. 54 년간의 프레이저 강 연구 기록이 그의 가설을 뒷받침하는 듯했지만, 결정적인 증명은 아직 없다. 어쩌면 우리는 영원히 완전히 알 수 없을지도 모른다. 고향을 향한 그 간절함의 정체를.
과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그 무엇, 본능이라 부르기엔 너무나 숭고한 그 무엇이 연어를 이끈다. 아담스 강 연어의 일생을 숫자로 풀어보면 가슴이 먹먹해진다. 암컷 한 마리가 2천에서 4천 개의 알을 낳는다. 부화하는 치어는 900 마리. 1 년을 강과 호수에서 버티며 자란 후 바다로 나가는 어린 연어는 250 마리. 그들이 헤엄치는 길목마다 민물고기와 새들이 기다리고 있다. 태평양에서 2~3 년을 살며 성어가 된 연어 중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은 9 마리. 그리고 마침내 산란을 마치고 생을 다하는 연어, 단 한 마리. 4천 개의 알에서 시작해 단 하나만이 생명의 순환을 완성한다. 이것은 잔인한 통계인가, 아니면 생명의 전략인가. 99.975%가 사라져야 0.025%가 다음 세대를 이을 수 있다는 이 냉혹한 수식 속에, 역설적으로 생명의 끈질긴 의지가 숨어 있다.
연어에게 귀향은 축제가 아니라 전쟁이다. 치어의 상태에서 1 주일간 프레이저 강을 따라 바다로 내려갈 때부터 위험은 시작된다. 바다가 아무리 풍요로워도, 연어는 고향을 잊지 못한다. 북미에 사는 한인들이 세월이 흘러도 한국 신문을 읽고 모국을 그리워하듯, 연어는 자신이 태어난 그 강물의 기억을 가슴에 품고 산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돌아온다.
모천의 귀환은 선택이 아니라 존재 이유다. 고향 회귀는 연어의 운명이다. 인간은 타향살이 서럽다고 노래하고, 고향이 그립다고 넋두리를 해도 막상 모든 것을 정리하고 귀향하는 사람은 드물다. 그러나 연어는 다르다.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더라도 반드시 돌아간다. 이것이 연어의 숙명이고, 동시에 연어의 존엄이다. 귀향길은 한가롭거나 평화롭지 않다. 강 어귀에는 곰이 입을 벌리고 기다린다. 나무 꼭대기에서는 흰머리 독수리가 호시탐탐 노린다. 인간의 낚시와 그물이 강을 가로막는다. 이 모든 죽음을 통과해야만 고향에 닿을 수 있다. 그런 처절한 여정에서 살아남는 것은 단 한 마리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 한 마리가 있기에 연어의 역사는 계속된다.
겨울 강가에 조용히 녹아드는 대신, 그들의 시신은 다시 생명이 된다. 겨울이면 스콰미시 브로컨데일 강 주변으로 수천 마리의 흰머리 독수리가 모여들고, 프레이저 강을 따라 곰과 독수리가 몰려드는 이유다. 연어의 사체는 그렇게 뜯기고 사라진다. 연어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다른 생명을 먹인다. 그렇게 자신의 몸 전부를 고향에 바친다. 다른 생명에 헌신한다. BC 주는 이 처절하고 경이로운 생명의 드라마를 목격할 수 있는 지구상 유일한 곳이다. 가을날 단풍이 붉게 물드는 날, 코퀴할라 하이웨이를 달려 캄룹스를 지나 아담스 강으로 가는 길. 그곳에서 우리는 4천분의 1의 기적을 본다. 죽음을 무릅쓰고 고향으로 돌아온 생명을, 자신의 전부를 바쳐 다음 세대를 잇는 감동적인 붉은 물결을 본다. 연어의 삶과 귀소본능은 고국을 떠난 한인들의 어떤 모습을 비춘다. 태평양을 건너온 사람들. 낯선 땅에서 뿌리내리고 살아가면서도 끊임없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한국 신문을 읽고,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음식을 먹으며 기억을 지키는 사람들. 하지만 연어와 우리는 다르다. 연어는 반드시 돌아가지만, 우리는 돌아가지 않는다. 아니, 돌아갈 수 없다. 아니, 돌아가지 않기로 선택한다. 우리는 이곳에 또 다른 고향을 만들며 산다. 두 개의 고향을 가슴에 품고, 두 개의 정체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살아간다.
연어는 과학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보여준다. 자기장 이론도, 아미노산 가설도 설명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의미’다. 연어는 단순히 생물학적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연어는 자신의 존재에 의미를 부여한다.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 생명을 이어주고, 죽어서까지 다른 생명을 살린다. 이것은 본능 이상의 신비이다. 연어가 떠난 후 겨울 강은 다시 고요해진다.
그 강은 더 이상 예전의 강이 아니다. 연어가 가져온 영양분이 강바닥에 스며들고, 나무에 영양을 공급하고 다시 다음 해의 생명을 키운다. 죽음이 삶이 되고, 끝이 시작이 되는 자연의 순환을 이어간다. 강은 침묵한다. 차디찬 겨울 바람이 불고, 겨울 숲에 싸락눈 내리는 소리가 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