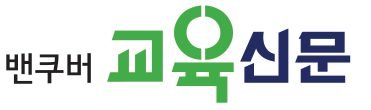2025년 12월 하늘은 슬픔이다.
요즘 사회를 바라보며 느끼는 감정은 안타까움을 넘어 불안에 가깝다.
옳고 그름을 스스로 고민하기보다, 보이지 않는 ‘기대층’의 분위기에 기대어 움직이는 경향이 너무도 짙어졌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기대층은 특정 집단이 아니라, “남들은 이렇게 생각하더라”는 막연한 여론의 그림자를 일컫는다. 문제는 이 흐름이 개인의 판단 능력을 약화시키고 더 나아가 대체하기도 하며 사회 전체를 ‘신념 없는 시대’로 밀어 넣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한 대학생을 상담하며 이를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는 전공 선택을 두고도 자신의 관심이나 재능보다 “친구들이 다 경영학을 가니까”, “요즘은 그게 유리하대요”라는 이유를 반복했다. 정작 본인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는 명확히 말하지 못했다.
선택은 있었지만 판단은 부재했다. 기대층의 흐름이 개인의 삶까지 침투하는 아주 쉬운 사례인 것이다.
판단하지 않으니 책임도 지지않고 책임지지 않으니 고민은 얕아지며 결정이 흔들리는 현상, 이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현상으로 확장되고 있다.
직장과 조직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은 듯 하다. 안건에 대해 깊이 검토하기보다 “윗선이 좋아할 방향”, “요즘 트렌드상 이게 안전한 선택”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기준이 된다.
실제로 한 공공기관에서는 중요한 정책 회의에서조차 명확한 분석보다 ‘여론 눈치 보기’가 논의를 지배해 결국 무의미한 결론을 내는 경우는 흔히 확인할 수 있는 실정이다.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도, 책임지려는 사람도 없기에 기대층에 기댄 판단이 낳는 가장 전형적인 부작용일 것 같다.
실제로 최근 2년간 해외에서 임했던 봉사단체의 모습 또한 다르지 않았다.
봉사라는 이름 아래 형식만 남고, 그 이면에는 이념도 신의도 분명하지 않은 태도가 자리하고 있었다. 리더가 바뀌면 가치도 함께 바뀌었고, 어제까지의 신념은 오늘의 불편함이 되었다. 한때 자유와 책임, 신의를 외치며 함께했던 선배들의 모습은 이제 추억 속 장면으로만 남아 있다.
이러한 흐름은 쉽게 접하고 세상 속 놀이터가 된 온라인 공간에서는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 빠르게 소비되는 정보 속에서 깊은 사유보다 즉각적 반응이 우선하고, 다수가 클릭한 방향이면 그 또한 진실처럼 받아들여지는…
복잡한 문제를 단번에 단순화시키지만, 동시에 우리의 사고 능력을 서서히 잠식하는 흔한 일을 자주 접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그리워하는 신념이란, 고집스러운 확신이 아니다. 그것은 타인의 시선과 분리된 ‘판단의 중심’을 세우는 일이다. 자신의 선택에 책임지겠다는 의지, 그로부터 출발하는 사유의 태도이다.
사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생각이 살아 있어야 하고, 서로 다른 판단이 충돌하며 성찰을 낳아야 한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거창한 개혁보다 오히려 훨씬 기본적인 질문이다.
“나는 왜 이렇게 판단하는가? 이 생각은 정말 나의 것인가?”
이 자기 성찰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어떤 제도도, 어떤 개혁도 공허할 수밖에 없다.
기대층의 흐름에 떠밀리는 개인이 많아질수록 사회는 결국 방향을 잃는다.
신념 없는 시대일수록, 자신의 판단을 스스로 지켜내려는 작은 결단이 더욱 절실하다.
2026년은, 적어도 지금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 판단의 무게를 감당할 용기를 회복하는 해이기를 바란다. 그때서야 비로소 이 슬픈 하늘에도 희망이라는 이름의 틈이 생길 것이기에 오늘도 용기를 내어 글을 쓴다.